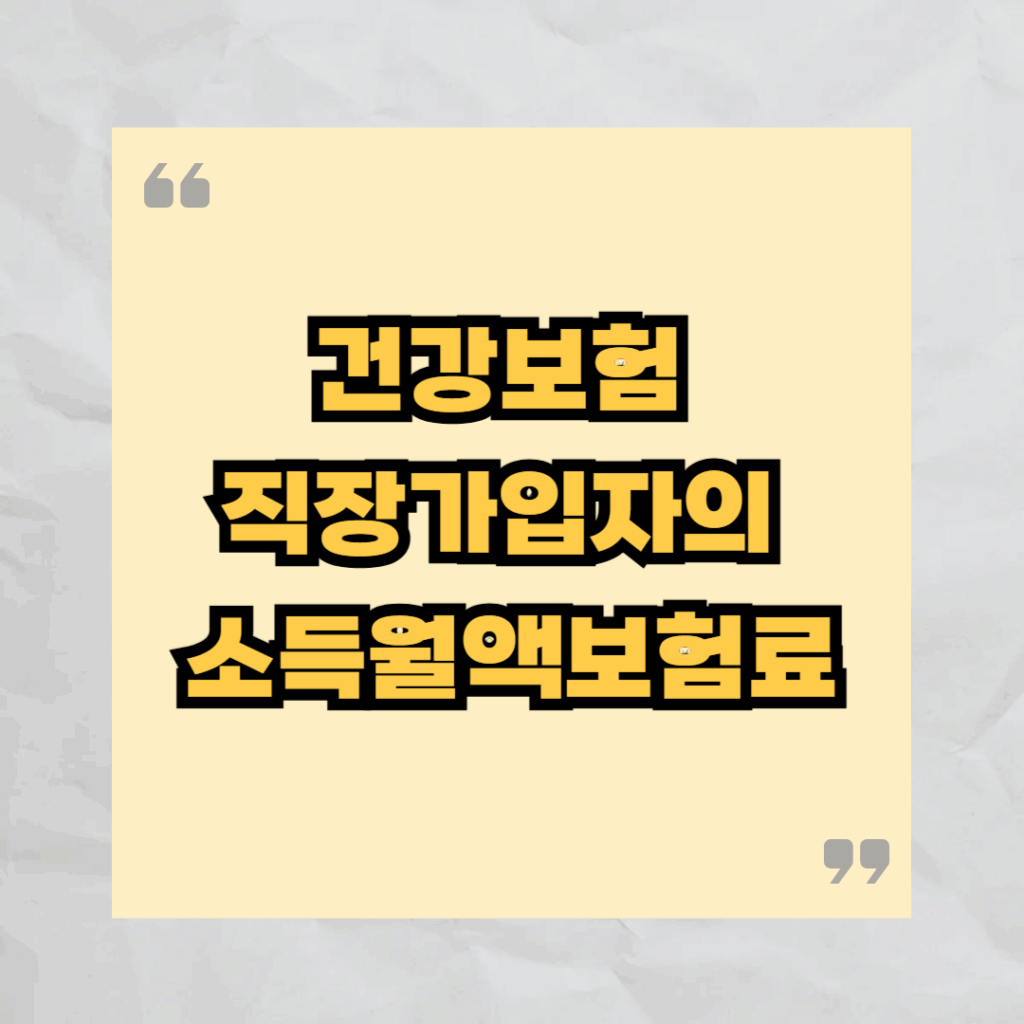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급여에 매겨지는 ‘보수월액보험료’를 내고, 급여 외에 발생한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돼요. 두 보험료의 성격과 계산 방식, 부담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예상치 못한 추징을 예방하고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중심으로 대상 기준, 계산식, 실제 사례, 정산·고지 일정, 자주 생기는 오해와 점검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요. 숫자 예시는 ‘가정’ 값으로 보여주며, 해당 연도의 정확한 요율·공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를 다시 확인해요.
소득월액보험료 개요와 보수월액과의 차이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갈래예요. ① 급여(보수)에 부과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② 급여 외 종합소득에 추가 부과되는 소득월액보험료예요. 두 항목은 과세 기반과 부담 주체, 정산 방식이 달라요.
보수월액보험료는 회사가 매월 급여 신고한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대등) 분담해요. 반면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 외의 보수 외 종합소득에 대해 개인이 전액 부담해요. 회사 분담은 없어요.
소득월액보험료는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자료가 연동되어 ‘다음 연도’에 월할(12분의 1)로 고지되는 구조가 보통이에요. 그래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소득이 기준선을 넘으면, 다음 해에 추가 보험료가 매월 청구될 수 있어요.
🧩 비교 한눈표
| 구분 |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
|---|---|---|
| 과세 기반 | 급여(과세 보수) | 보수 외 종합소득 |
| 부담 주체 | 회사 50% + 근로자 50% | 근로자 100% |
| 고지 시점 | 매월 급여 지급 시 | 다음 해 월할 고지 |
부과 대상 소득과 적용 기준선
소득월액보험료의 대상은 ‘보수 외 종합소득’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 사업·임대, 기타, 연금 등 종합과세 항목이 포함돼요. 단, 실제 반영 범위는 법령·고시에 따르니 연도별 안내문을 확인해요.
기준선은 ‘연간 보수 외 종합소득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예요.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월할로 부과돼요. 기준금액은 제도 개편으로 조정될 수 있어요. 고지서에는 ‘연 소득, 공제 후 적용 소득, 월 부과액’이 함께 표시돼요.
보수월액용 급여에는 비과세 복리후생 일부(예: 식대 한도 내, 자가운전 보조비 등)가 제외되며, 소득월액 대상인 보수 외 소득은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으로 공단이 자동 반영해요. 본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반영되지만, 이의가 있으면 소명 절차가 있어요.
📑 포함·제외 예시
| 구분 | 예시 | 비고 |
|---|---|---|
| 포함 가능 | 이자·배당·사업/임대·기타·연금 일부 | 종합소득 과세자료 중심 |
| 제외 가능 | 근로소득(급여), 비과세 복리후생, 일부 양도 | 연도별 고시 확인 |
계산식·요율·부담 주체 핵심 정리
소득월액보험료의 기본 구조는 간단해요. (보수 외 종합소득 − 기준금액) × 건강보험료율 ÷ 12를 바탕으로 월 부과액이 계산돼요.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연동되어 추가돼요.
요율은 매년 공단이 고시해요. 아래 표의 요율은 ‘예시(가정)’이며, 실제 연도 요율은 공단 공고를 확인해요.
🧮 계산식 요약(예시 요율 가정)
| 항목 | 계산 | 비고 |
|---|---|---|
| 월 건강보험료(예시) | {(연간 보수외소득 − 기준금액) × ①요율} ÷ 12 | ① 건강보험료율(연도별) |
| 월 장기요양보험료(예시) | 월 건강보험료 × ②요율 | ② 장기요양보험료율(연도별) |
| 부담 주체 | 근로자 전액 | 회사 분담 없음 |
사례로 보는 계산 예시(급여+보수외소득)
예시 가정: ① 건강보험료율 7.10%, ② 장기요양보험료율 12.8%, 기준금액 2,000만원이라고 가정해 계산해볼게요. 실제 연도 요율·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 케이스별 월 부과액(예시·가정)
| 보수외 연간 소득 | 초과분 | 월 건강보험료 | 월 장기요양 | 월 합계 |
|---|---|---|---|---|
| 2,400만원 | 400만원 | (4,000,000×0.071)/12 ≈ 23,667원 | ≈ 3,030원 | ≈ 26,697원 |
| 4,000만원 | 2,000만원 | (20,000,000×0.071)/12 ≈ 118,333원 | ≈ 15,147원 | ≈ 133,480원 |
| 7,000만원 | 5,000만원 | (50,000,000×0.071)/12 ≈ 295,833원 | ≈ 37,872원 | ≈ 333,705원 |
내가 생각 했을 때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 ‘회사 분담 유무’예요.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100% 부담하고, 급여에 매겨지는 보수월액보험료만 회사와 반반이라는 점을 기억해요.
신고·부과·정산 일정과 납부 방식
흐름은 보통 이렇게 이어져요. ① 해당 연도에 보수 외 종합소득 발생 → ② 다음 해 5월 종소세 신고 → ③ 공단이 국세청 자료 연계 → ④ 고지서 산출(월할) → ⑤ 매월 납부. 중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소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 타임라인 요약
| 단계 | 내용 | 유의사항 |
|---|---|---|
| 소득 발생 |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 증빙·원천징수 확인 |
| 종소세 신고 | 다음 해 5월 | 합산·분리 여부 점검 |
| 공단 연계 | 자료 연동·월할 산정 | 요율·기준 반영 |
| 고지·납부 | 매월 자동이체/납부서 | 연체시 가산금 |
오해 빈출 Q·점검 체크리스트
① 회사 분담: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 분담이 없고 본인 100%예요. ② 기준금액: 초과분에만 부과돼요. 기준 미만이면 추가 부과가 없을 수 있어요. ③ 보수·소득 중복: 같은 항목을 중복 부과하지 않지만, 급여와 별개 소득은 별도 과세돼요.
✅ 셀프 점검표
| 체크항목 | 질문 | 예/아니오 |
|---|---|---|
| 보수 외 소득 합계 | 기준금액을 초과했나요? | □ / □ |
| 이자·배당 증빙 | 연말·원천징수 확인했나요? | □ / □ |
| 임대/사업 | 종합소득 신고 반영됐나요? | □ / □ |
| 고지 내역 | 월 건강+장기요양 분리 확인했나요? | □ / □ |
FAQ
Q1. 소득월액보험료는 언제부터 내야 하나요?
A1. 보수 외 종합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은 ‘다음 해’부터 월할로 고지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Q2. 회사가 절반을 내주나요?
A2. 아니에요.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100% 부담해요. 회사 분담은 보수월액보험료에만 적용돼요.
Q3. 기준금액 미만이면 아예 부과가 없나요?
A3. 보통 초과분에 대해 부과돼요. 기준선 미달이면 추가 부과가 없을 수 있어요(연도별 고시 확인).
Q4.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A4. 이자·배당·사업/임대·기타·연금 등 종합소득이 중심이에요. 정확한 범위는 해당 연도 공단 안내를 봐요.
Q5.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5. 산출된 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추가돼요. 요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Q6. 분할납부나 조정이 가능한가요?
A6. 납부 방법은 고지서 안내를 따르며, 경제적 곤란 시 공단에 분할·유예 가능 여부를 문의해요.
Q7. 월급 인상으로 보수월액이 바뀌었어요. 소득월액에도 영향 있나요?
A7. 보수월액보험료에는 영향이 있지만,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 기준이라 별개예요.
Q8. 고지 금액이 예상과 달라요. 어떻게 확인하죠?
A8. 고지서의 ‘소득 산정 근거(연 소득·초과분·요율)’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단에 이의신청·소명을 해요.